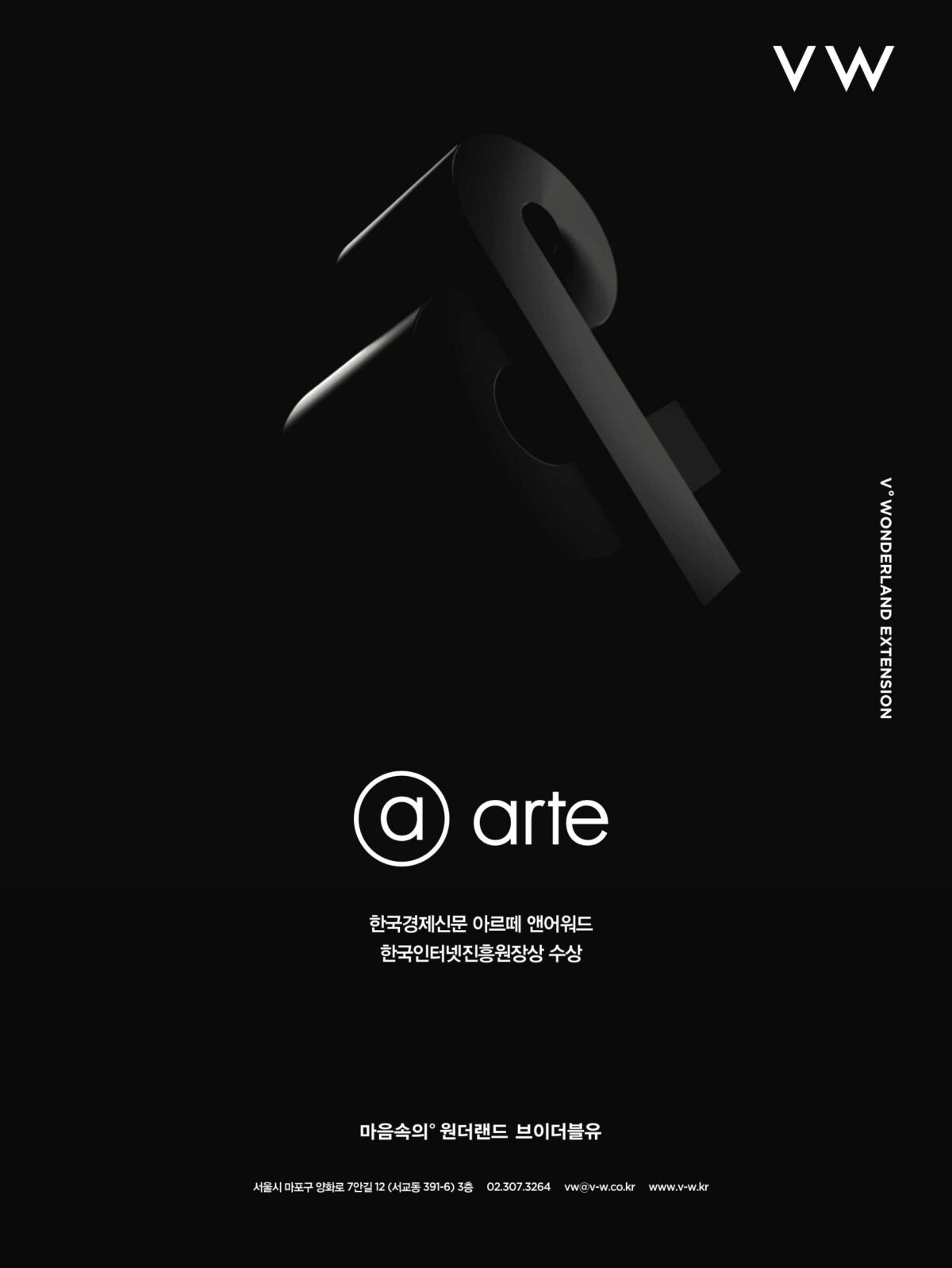플랫폼이 은행이 되는 시대
고객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경우 금융 인프라와 금융산업 발달이 더디면서 플랫폼 기업이 직접 금융업 라이선스를 획득하며 금융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중국의 결제 문화를 단숨에 바꿨다. 계산대 체류시간을 극단적으로 감소시킨 ‘알리페이’와 ‘위챗 페이’는 실제로 지불결제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렇듯 IT 공룡기업이 만들어 낸 서비스 하나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중국의 결제 문화를 바꾼 셈이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 플랫폼은 금융업에 직접 뛰어들기보다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 채널로 확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국내 한 시중은행은 수신상품의 판매량이 내부 채널과 외부 플랫폼이 유사하기까지 하다. 국내 대표 플랫폼인 카카오나 네이버도 간편 결제와 송금 서비스로 시작해 예·적금, 대출, 펀드, 보험 서비스 등 상품 판매 역할로 금융 서비스를 확장했다.

국내는 특정 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규제가 있어 실제 사용자는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따라서 국내 대형 플랫폼은 금융상품의 판매를 대리하거나 홍보하는 수준에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이용자를 붙잡기 위한 목적(Lock-in)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제로 전통 금융회사 주 업무였던 상품 결제나 포인트 서비스 등은 이미 상용화,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얼마 전 론칭한 네이버 통장은 은행이 아닌 플랫폼 회사에서 제공하는 계좌 기반 서비스다. 이 통장에서 네이버에서 발생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경우 포인트 혜택을 준다. 또한 증권사와 연결한 CMA 통장을 통해 고객에게 매일 높은 금리의 이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한다.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통장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밀착형 결제 혜택을 누리는 고객을 락인하는 장치로 활용한다.
플랫폼이 금융회사와 다른 점은 사용자의 라이프사이클과 관련한 데이터를 파악하면서 고객의 금융 행태뿐만 아니라 스토리를 수집한다는 데 있다. 결제 시점의 데이터만 수집하던 것에서 결제 전후에 대한 사용자 태도와 피드백을 수집하면서 플랫폼은 진정 고객을 이해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어느 시점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안내하고 자연스럽게 이끈다. 스티브 잡스는 ‘고객은 우리가 뭔가 보여주기 전에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고객이 무지(無知)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서비스와 의사결정의 복잡함 속에서 고객의 니즈를 먼저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아닐까?
‘알리페이’ 내 ‘미니앱’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알림과 도움말을 먼저 제시한다. 또한 개인마다 다른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추천 서비스와 할인쿠폰 등을 제공한다. 단순한 페이 서비스가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시간에 어떤 매장을 가는지, 선호하는 브랜드와 제품은 무엇인지 빅데이터 분석으로 모두 알고 있다. 금융 서비스는 플랫폼에서 도구로 활용될 뿐 고객의 일상에서 스토리를 읽는다. 따라서 고객은 내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알리페이’에서 ‘타오바오’의 상품 구매, 송금, 음식 배달, 공공요금 납부, 택배, 항공권 예매, 범칙금 납부 등 생활 속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한다.

특히 우리의 메인 타깃이 될 밀레니얼 세대는 전통 은행의 디지털 뱅킹에 대한 만족도가 50% 수준인 것에 반해 IT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이용에 대해서는 74%가 호의적 태도를 보인다. IT 기업의 서비스는 단순히 금융 거래 내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과 빅데이터 분석력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구글은 당좌예금 계좌 서비스(수표 발행이 가능한 예금) 론칭을 발표했다. 구글은 이미 개인의 연락처, 주소뿐 아니라 지도와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이동 정보, 월급과 소비 패턴과 같은 재무정보까지 보유하고 있다. 개별 소비습관을 중심으로 한 IT 기업의 페이 서비스를 넘어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한 금융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에 헬스케어 기업인 ‘어센던트’와 파트너십으로 건강정보와 금융정보를 엮어 전방위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한다.

이미 플랫폼이 금융 서비스를 시도한 성공사례는 넘친다. 다만 앞으로도 등장할 IT 기업들의 금융 서비스는 고객을 이해하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고객은 더 이상 전통 은행의 계좌보다는 어떤 플랫폼과 어떤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하느냐를 중요시한다. IT 기업이 중국의 고질적인 결제 문화를 반전시킨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계좌번호를 외우기도 했고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찾느라 애썼다. 인증서 유효기간이라도 지나면 당장 은행에 뛰어가야 했다. 간편 송금이 등장한 지 겨우 몇 해 지났다. 이 작은 변화는 이제 정책적 지원, 기술과 데이터를 만나 고객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서비스의 등장을 초래했다.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조건 아래 고객이 시간과 발품을 팔아야 할 만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고객의 거래 내역이 아니라 개개인이 가진 삶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디자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