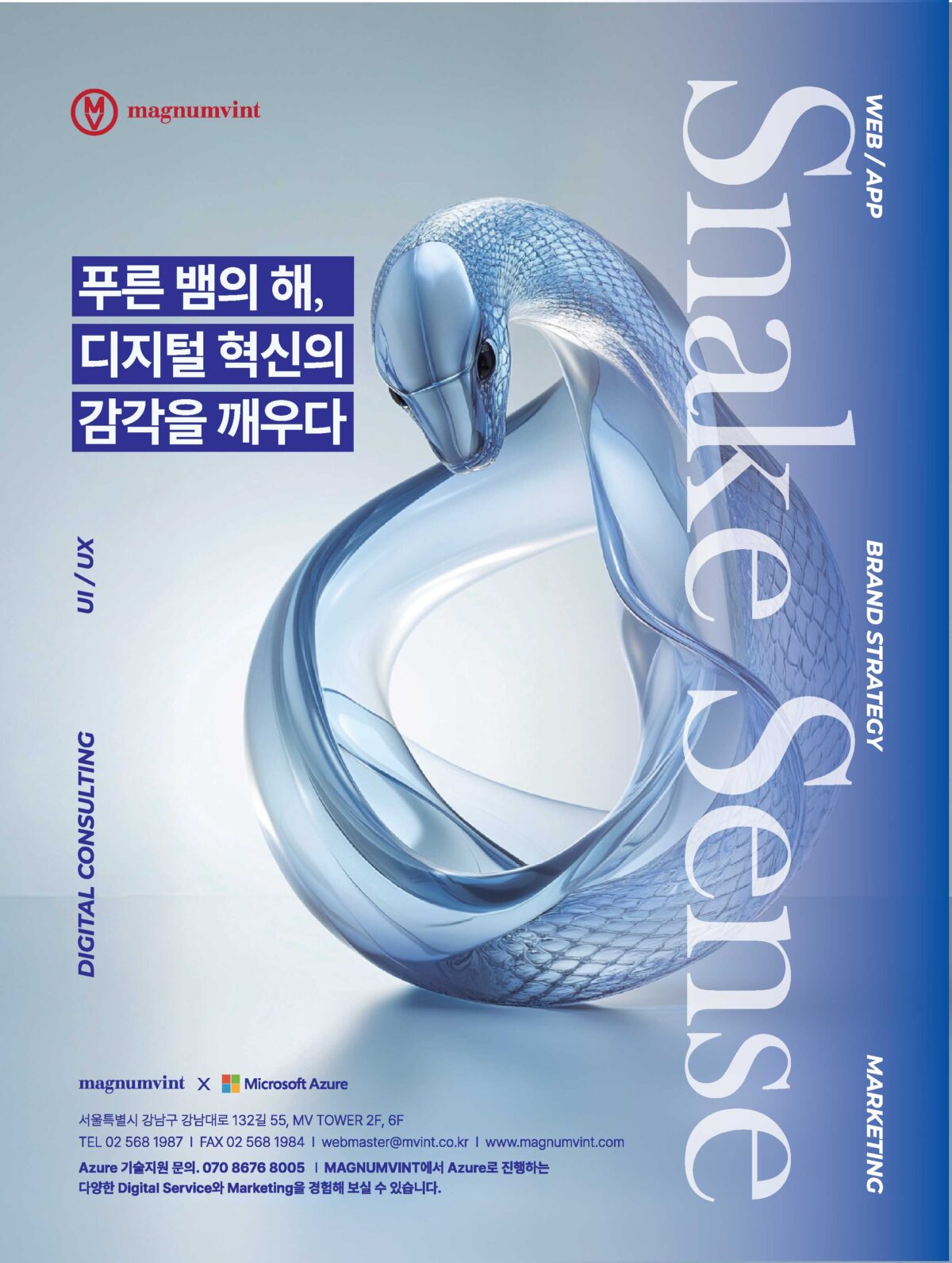증강현실, 혼합된 몸 스키마에 결 맞추기
현실과 가상의 결합

글. 공화연 UX 리서처 flohello@naver.com
증강현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실제 환경 위에 가상 객체의 정보가 보이는 것으로, 가상 이미지를 실제에 결합시키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증강현실은 크게 이미지 기반과 영상 기반, 그리고 위치 기반 등의 기술로 나뉜다. 이미지 기반의 증강현실은 증강되는 마커(Marker)를 활용해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영상 기반 증강현실은 영상을 인식해 관련 동영상이나 정보가 등장하는 것이며, 위치 기반 증강현실은 움직이는 현실 세계에 가상 정보가 겹쳐져 보이게 하는 것이다.

AR을 이용한 사례는 매우 많겠지만, 일단 디지털 매뉴얼을 들 수 있다. 매뉴얼은 흔히 우리가 복잡한 제품을 다루거나 수리할 때 참조해 보는 정보 문서인데, 주로 종이 매체로 제작된다. 사용자는 목차나 인덱스를 이용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콕 짚어 찾아내야 하는데, 어디를 모르는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매뉴얼이 두꺼울수록 사용자의 두통도 심해진다.
디지털 시대, 네트워크와 연결된 다양한 디지털 장비, 모바일이나 태블릿 PC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매뉴얼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AR 매뉴얼이 제일이다. 고장난 부위에 가져다 대면 알아서 동그라미를 쳐주고, 팁을 보여주며, 가이드까지 시각화 해주기 때문이다.
해외는 물론 국내 유명 자동차 회사가 제공하는 AR 매뉴얼 서비스도 그러하다. 심지어 전문가와의 연결로 전문가가 마치 창을 통해 고장난 내 차를 직접 보듯이 바로 문제점을 알려주기도 한다. 또 조만간 AI가 그 일을 대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쓰이는 유용한 기술은 분명 AR인데, 현실의 상황에서 파워풀한 디지털 콘텐츠가 입혀져 사용자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의료 분야에서는 이미 AR 서비스가 친숙한데, 그 중 하나가 수술을 도와주고 가이드해주는 시스템이다. 의료 영상과 환자 몸의 좌표계를 맞추는 정합(Registration) 과정을 거치고 나면, 환자 몸에 오버랩된 여러 수술에 필요한 시각화 정보, 수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수술 시 정확성을 위한 가이드도 제공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다양한 전문 영상을 현실에 있는 환자의 몸과 번갈아 보면서 진료했다면 지금은 사람 몸에 가상의 콘텐츠가 혼합된 상태에서 환자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이렇게 섞이고 있는 중이다.

혼합 환경
현실과 가상의 디지털 콘텐츠를 섞는 과정 즉, 증강현실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가상현실만을 만들 때보다 훨씬 어렵다고 한다. 아마도 현실과 가상이라는 이종 간 적합한 결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이미 자리잡고 있는 현실의 결을 파악하면서 가상의 콘텐츠를 잘 섞이게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리라. 현실은 우리에게 익숙해 쉬울 것 같지만 실제의 현실은 매우 복잡하고, 이는 마치 알고있는 상식도 쉬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와 유사하다. 어쨌든 디지털을 끼워 맞추기 위해, 우리는 기존에 분석해 보지 않았던 우리 현실의 상식을 파고들 수밖에 없어진 것이다.
현상학적 체현 인지(Phenomenological-Embodied Cognition)라는 관점이 있는데, 이는 철학적 관점과 인지과학적 관점이 합쳐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융합 기술의 접근은 이처럼 융합 학문적 접근을 포다 포괄적으로 허용 할 것이다. 철학자 메를로 퐁티(Maurice Merleau Ponty)의 ‘지각의 현상학’이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우리의 아날로그적인 공간에 ICT가 섞이며 지각은 확장됐고, 인지를 위한 몸의 스키마도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인문학적 관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메를로 퐁티 철학 개념 중 지각의 확장은 사람의 공간과 몸으로 파고드는 제품들의 UX를 설계하는데 유용한 통찰을 준다.
메를로 퐁티의 핵심적인 신체 개념으로 Lived Body가 있는데, 이는 체험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몸에 대한 관점이다. 또한 인간은 존재함에 있어 몸의 스키마를 상정하게 되는데, 따라서 몸의 스키마는 시시각각 변하게 된다는 논리 구조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몸의 스키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경험은 불편함이 될 수 있다.
혼합 환경에서 움직이는 몸의 스키마 결에 맞는 UX 만들기
대결하는 게임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앞에는 대결 상대가 있고, 내 손에는 조작을 위한 장비가 있다. 혹여 버튼이나 마우스를 통해 눈앞에 있는 대결 상대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 경우 조작방식은 실제 사용자 행위와 결이 안 맞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조작방법은 실제 대결할 때 하는 동작을 하면서 대결하게 해 주는 것이다. 손에 디지털 장갑을 끼우게 하고, 허공이라도 휘두르게 한다. 아까의 마우스와 키보드 조작에서보다는 더 결이 맞는다. 이번에는 장갑 앞쪽에 특수 장치를 통해 사용자가 주목을 휘두를 때마다 압력을 느끼게 한다. 결이 점점 더 맞아 떨어지고 있다.

체화된 인지를 SUPPORT 할 때, 사용자는 더 자신의 행위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을 체감형 게임이라고 하는데, 용어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현실에 익숙하거나 습관화된, 그래서 당연한 듯이 행위하는 결에 혼합된 디지털 콘텐츠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씌워 준다면, 결을 맞출 수 있다.
결이 잘 맞춰진 게임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는 실제 오른쪽 주먹을 사용해 신체적 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스크린에서 실시간으로 동일하게 재현되는 사용자 자신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경험한다. 즉 체감형 게임의 동작 인식 인터페이스는 게임하기의 경험을 변화시킨다.
인지심리학자 중 인간의 몸을 세상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인터페이스로 설명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외부환경에 대한 자극을 인간은 몸 전체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이라면 혼합 환경에서의 인터페이스는 사람의 몸에 디지털 콘텐츠를 위한 인터페이스가 인간의 몸의 결에 잘 맞춰 덧입혀주는 개념일 것이다.
디지털과 섞인 공간에서의 UX
디지털로 확장된 서비스 환경에 대해, 어느 한쪽만을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둘다 고려해서 사용자가 기대하는 몸 틀을 알아내고, 이에 FITTING 해줄 수 있는 몸 틀의 결을 맞춰줘야 한다.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 융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이유는 인간 개개인이 어떤 목적을 위한 행위에서 인지적으로 좋은 성능을 발휘하기 위함일 것이다. 따라서 UX 설계자들은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인간에게 최상의 퍼포먼스를 줄 수 있는 UI 인지를 늘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