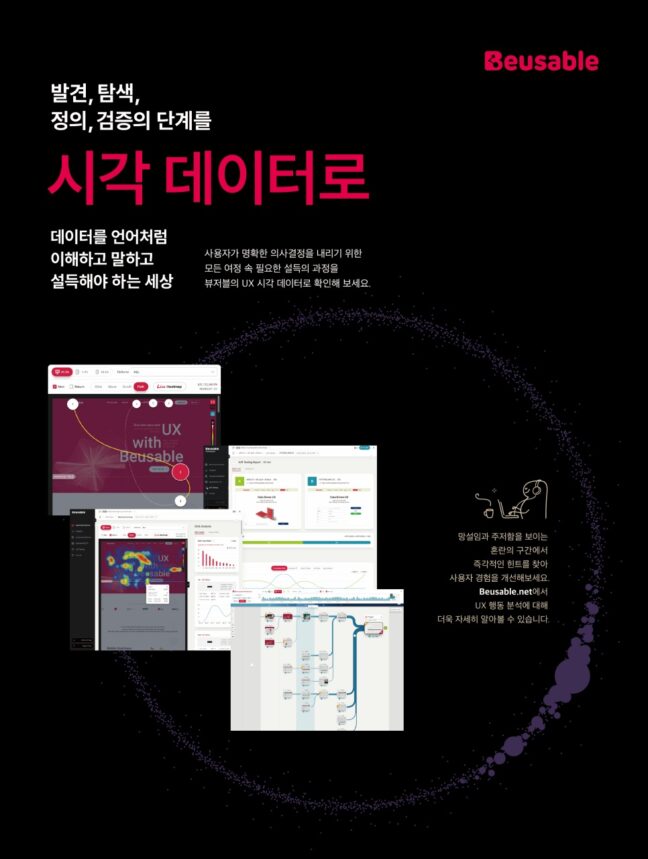같은 뜻 다른 단어, 혼란스러운 고객
제3화 사용자 중심의 일관된 메시지 전달하기(마지막 회)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택트(On-Tact)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온택트의 중심은 활자와 영상이다. 영상의 부족분은 UX writing이 채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과정에서 일관적인 문장을 전달하기 위해 살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번 회는 총 3부작의 마지막 편으로 메시지의 일관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문장 톤앤매너, 숫자와 단위 표현방식 등에 대해 소개한다.
흔히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일관성’의 중요성을 얘기한다. 한 친구는 일관성을 갖고 대화를 하는 한편, 다른 한 명은 대화 중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거나 주어나 목적어를 자주 생략한다면 대화의 흐름을 이어갈 수 없다. 즉, 메시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해가 부족해 오해를 낳았기 때문이다. 직접 얼굴을 보며 나누는 대화도 일관성이 중요한데, 하물며 비대면으로 나누는 활자는 오죽할까 싶다. 모름지기 글이란 일관성을 유지해야 흐름을 탈 수 있고, 올바른 판단과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문장의 일관성을 유지한 채 고객과 올바른 소통을 하고 행동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일관된 용어, 직관적인 표현,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어투, 간결성, 숫자와 통화 단위의 통일 등을 바르게 적용해야 한다. 글을 쓸 때 고객에게 익숙하지 않은, 낯선 용어보다 쉽고 간결하면서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면 고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문장 톤앤매너다. 한 문장마다 같은 뜻의, 유사한 의미의 용어를 다르게 사용한다면 고객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혼란스러울 수 있다.
| 확인사항/유의사항/참조사항/이용안내 |
고객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해당 매뉴얼을 찾아 텍스트를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확인사항’, ‘유의사항’, ‘참조사항’, ‘이용안내’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다면 고객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러한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쓴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유사한 뜻을 가진 단어를 하나로 모은 후 이를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나 단어로 바꾼 후 통일한다. 위에 나열한 용어 외에도 ‘꼭! 알아두세요’라는 서술형으로 작성해도 좋다. 여기서 잠깐. 제목은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는 사실!
문장 형식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정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유의사항을 작성할 때 글의 형식을 일관되게 맞추는 것이다. 띄어쓰기도 통일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안내 글의 각 항목마다 블릿(?)을 넣어 ‘~합니다’의 문장형 종결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끝까지 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블릿 아래 추가 항복에 붙임표(-)를 넣어 ‘~임’, ‘~함’이라는 명사형 종결로 쓰고자 했다면 그 문장의 형식도 일관되게 맞춰야 한다.
툴팁 문장의 종결형은 명사형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짧고 간략한 안내를 위해서다. ‘숫자만 가능합니다’를 ‘숫자만 사용할 수 있음’, ‘동일한 숫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는 ‘동일한 숫자는 등록할 수 없음’ 등으로 통일해 쓰도록 한다.
반복하지만 일관된 메시지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혼용되는 용어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유사한 뜻을 내포하고 있거나, 문장 내에서 서로 의미하는 바가 동일할 때는 하나의 용어로 일관성을 유지하면 고객(사용자)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비슷한 용어를 혼용하기보다 더 쉽고 많이 쓰는 용어를 기준으로 삼는다.
| 혼용해 사용한 용어 예시 | 권장 용어 |
| 카드고유확인번호/CVC 번호 | CVC 번호 |
| 아이핀/i-Pin/iPIN | 아이핀(이해 쉽도록 한글 사용) |
| 팩스/FAX | 팩스 |
| 전화/TEL | 전화 |
| 명세서/청구서 | 명세서 |
| 웹사이트/홈페이지/웹 사이트 | 홈페이지 |
| 이의신청제기/이의신청/이의제기 | 이의신청 |
| 남은 잔액/잔액 | 잔액 |
| 휴대전화/휴대폰/스마트폰 | 휴대폰 |
| 앱/어플리케이션/APP/app/Application | 앱 |
위 사례도 보자. ‘아이핀’만 보더라도 ‘i-Pin’, ‘iPIN’ 등 영문으로 혼용하는 것은 물론 대소문자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용자에게 그만큼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그중 하나인 ‘아이핀’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화’, ‘TEL’도 전화로, ‘명세서’와 ‘청구서’ 등 혼용해서 사용하는 부분도 ‘명세서’로 일관성을 맞추는 것이 좋다.
단어의 일관성에 있어서도 유의어와 숫자, 단위 등을 통일해 사용해야 한다. 즉, 그 표현방식에 따른 부분인데, 가령 업무일과 휴무일 표현을 통일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말은 보통 ‘토요일, 일요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요일’도 공휴일에 포함되기에 구체적으로 ‘토요일, 공휴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이 또한 국경일도 공휴일로 사용함으로써 고객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통일 전) 요금 징수 시간 – 평일 : 오전 7시~오후 9시(14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국경)일은 발급무료 (통일 후) 요금 징수 시간: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토요일/공휴일 무료) 전환서비스는 평일 09:00~18:00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공휴일은 전환할 수 없음) |
날짜 표기도 통일해야 한다. 문장은 연월일을 YYYY년 MM월 DD일 형태로 표기하고 월과 일의 숫자 앞에는 0을 넣지 않는다.(잘못된 예. 2020년 07월 29일) 또한 도표 등 공간의 제약이 있을 는 연월일을 YYYY.MM.DD. 형태로 작성한다(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 규범에 따름). 다만, 특수한 경우에 한해 마지막 마침표를 생략할 수 있다. 빗금(/)이나 줄표(-) 등도 사용하지 않으며, 공간의 제약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공서 공문처럼 연도를 줄여서 쓰지 않는다.(잘못된 예. ‘20년 7월 29일)
이상으로 비대면 시대 고객과 소통하는 UX writing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봤다. 물론 UX writing에 정답은 없다. 하지만 하나의 기준이자 원칙이 있다. 독자가 보기에 이해가 쉬워야 하고,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메시지 전달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많은 시도가 이어져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깐깐하고 힘들게 구축한 서비스는 고객의 만족도가 높기 나름이다. 기사도 마찬가지다. 전체 맥락을 이용하고 고객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용어(단어)를 적확하고 짧게 전달하기 위해 문장을 쥐어 짠다. 그래야 독자는 기사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UX writing은 그런 자세에서 출발한다. 이 글은 어떤가?
글. 김관식 기자 seoulpol@wireli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