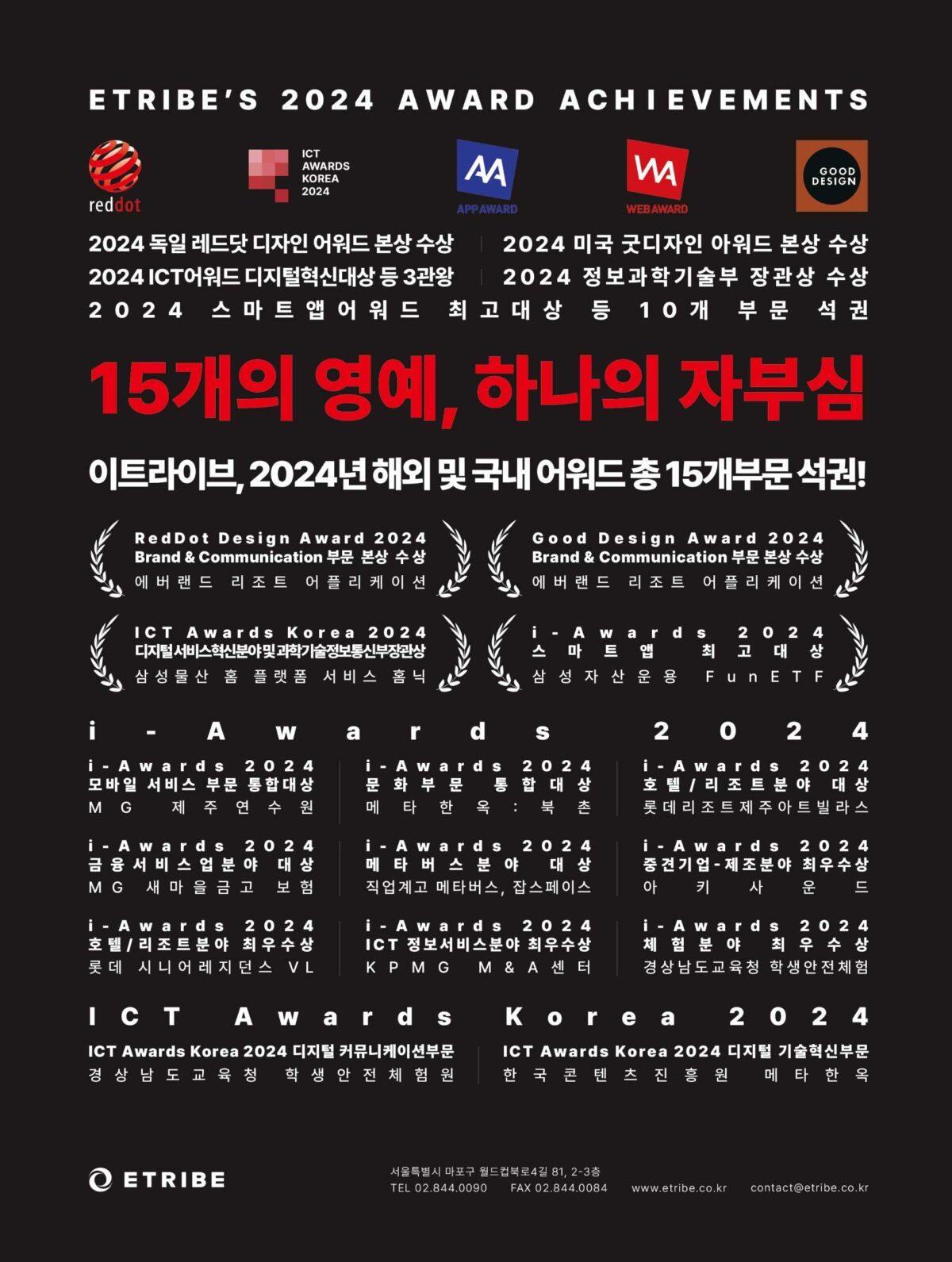정 준희님의 아티클 더 보기
《이상한 나라의 괴짜들 : Geek Zone》전
경계를 구분지을 수 없는, 작품들 전체가 하나의 작품같았던
K현대미술관
《이상한 나라의 괴짜들
: Geek Zone》
이상한 나라의 괴짜들 전시회에 발을 들였을 때, 제일 처음 눈에 띄었던 건 전시 구성이다. 작품과 작품 사이에 경계가 없다는 것.
기존의 다른 전시들과는 다르게 각각의 작가들에게 내재돼 있는 스토리들이 큰 카테고리로는 회화,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조각, 설치, 미디어 등으로 묶여 있었고, 그 안에는 한 가지 형식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작가들의 다양한 작업 방식이 서로 경계를 허물며 조화롭게 뒤섞여 있었다. 작가 개개인의 영역이 아닌 서로가 상상하는 모든 것에 대해 경계를 구분지을 수 없는, 전시회 자체가 하나의 독창적이고 새로운 현대예술 작품같았다.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디자인 작업을 하다 문득, 어렸을 때만 해도 크레파스와 색연필을 들고 새하얀 스케치북에 다부지게 그림을 그리던 내가 지금은 마우스를 쥐고 모니터를 보며 디자인 하고 있다는 사실이 뜬금없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생각해보니 옛날엔 붓과 목탄, 조각칼 같은 단순한 도구가 쥐어져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리고 만드는 방식이 다였지만 지금은 이를 포함해 수없이 다양해진 오브제와 재료, 여기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가상의 오브제까지 쥐어져 작업방식에 한계가 없어졌다. 즉, 현대미술에서는 작가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꿈꾸고 그리던 가상의 아이디어들이 마치 마술봉을 휘두르기라도 한 듯 생생한 현실로 표현될 수 있다.
괴짜 전은 현대미술에 주어진 것들을 120% 활용해냈다. 기본적인 미디어 프로그램을 활용한 작품에서부터 라인 드로잉에 네온을 적용해 사물로 형상화한 윤여준 작가의 ‘Great Big Eyes 01’, 포토 콜라주에 인형화 회화로 오브제들을 확장시킨 최나래 작가의 ‘알록달록빵글빵글하하호호’에 이르기까지. 작가들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한 통통 튀는 작품들이 얽히고설켜 펼쳐져 있었다.
작품이라는 확성기
직업 특성상 스스로의 디자인 철학보다는 원고를 중심으로 디자인을 한다. 어떻게 하면 텍스트가 더 잘 보일지, 잘 읽힐지, 이해도가 높을지 등등. 이와 다르게 다른 보통의 디자이너들이나 예술작가들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작품 안에 담아낸다. 자신의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사회적 현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성향들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하여 작품으로 전달한다.
괴짜 전의 작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 어떤 전시회보다 과거와 현재의 이슈들을 직설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수집된 시선 1’을 통해 타인의 시선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박현진 작가, 자아정체성을 독특한 피조물과 화려한 색감으로 나타낸 이피 작가, 성차별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가상세계의 정교한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이혜림 작가 등이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문제를 대담하게, 그리고 인상 깊게 표현해냈다. 이 작품들 외에도 상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작품이라는 확성기에 대고 마음껏 외치고 있는 작가들의 더없이 솔직한 작품을 마음껏 볼 수 있었다.
작품속으로
다양한 작업방식과 자유로운 표현방식의 경계와 한계를 무너트린 이 전시회의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작가와 관람객의 벽까지도 허물어버렸다는 것이다.
지하 전시장으로 내려가 보면 벽화, 비디오아트, 간판아트 등 여러 트렌디한 설치미술과 그 안에 함께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을 배치해 사진도 찍고 커피도 마시고 친구와 수다도 떨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다. 단지 작품만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품 속으로 들어가 그 일부가 되어 함께 참여함으로써, 작가의 성향을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괴짜 전은 우리 모두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작가와 관객의 커뮤니케이션까지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