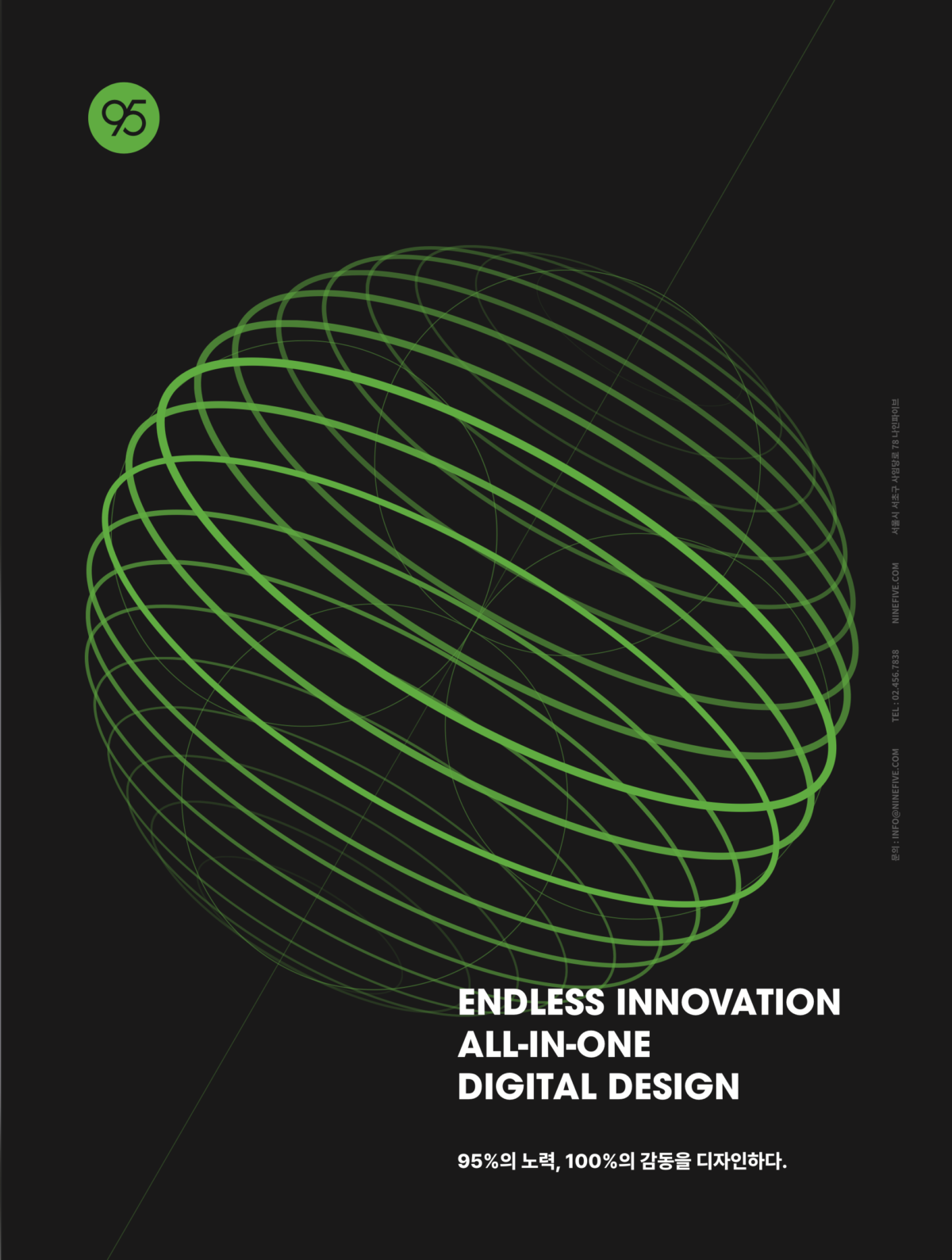현재의 챗GPT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까

많은 데이터를 조합해 문맥을 작성해 내는 인공지능으로 장안의 화제인 챗GPT가 AI(인공지능)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부분이 크고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인공지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가져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해 오혜영 카이스트 인공지능 인공지능연구원장의 답변이 눈길을 끈다.
오혜원 원장은 SDF다이어리에서 “챗GPT의 영향력은 언어 모델, 자연언어 처리 분야로 파괴적이고 파격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술이다. 기존의 알파고와 가장 큰 차이점은 알파고는 전문적인 영역에 국한된 AI였다면 언어 모델 기반의 AI는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적용한 AI로 알파고보다 훨씬 영향력이 클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챗GPT가 보여주는 소통은 몇 백억 개의 문서를 기반으로 뱉어내어 ‘사용자가 매우 큰 데이터베이스와 소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따라서 앞으로 발전할 AI는 사용자의 영역별로 세분화 될 것이고 사람이 지닌 특성이 다르고 오감이 있듯 AI도 기능이 축적되고 지식이 쌓여 오감을 가지고 각각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챗GPT 지속가능성에 대해 오 원장은 “사용자는 어떻게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할수록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기사 작성 시 튀르키예 지진을 주제로 공통된 사망자 수 같은 정보는 누구에게나 들어온다”고 짚으며 “한국은 지진에서 안전할지, 튀르키예 지진이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지, 건축과 정치적 구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자가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따라서 깊은 인사이트를 누가 갖고 있느냐가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AI 시장에서 많이 발전된 언어 모델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이 아시아를 어떻게 선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언어에 따라서 기술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AI를 학습시킬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원장은 과거 2007년 구글의 회장 에릭 슈미츠가 SDF 연사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를 떠올리며 “앞으로는 검색해서 없으면 세상에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디지털’ 기술이 이제는 모든 곳에 적용돼 보이지 않는 기술이 된 것처럼 AI도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적용돼 보이지 않는 기술이 될 것이다. 따라서 AI는 우리와 공존하게 될 것이고 당장 쓰지 않더라도 대학, 기업, 정부, 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볼 시기”라고 당부했다.
*출처 – SDF다이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