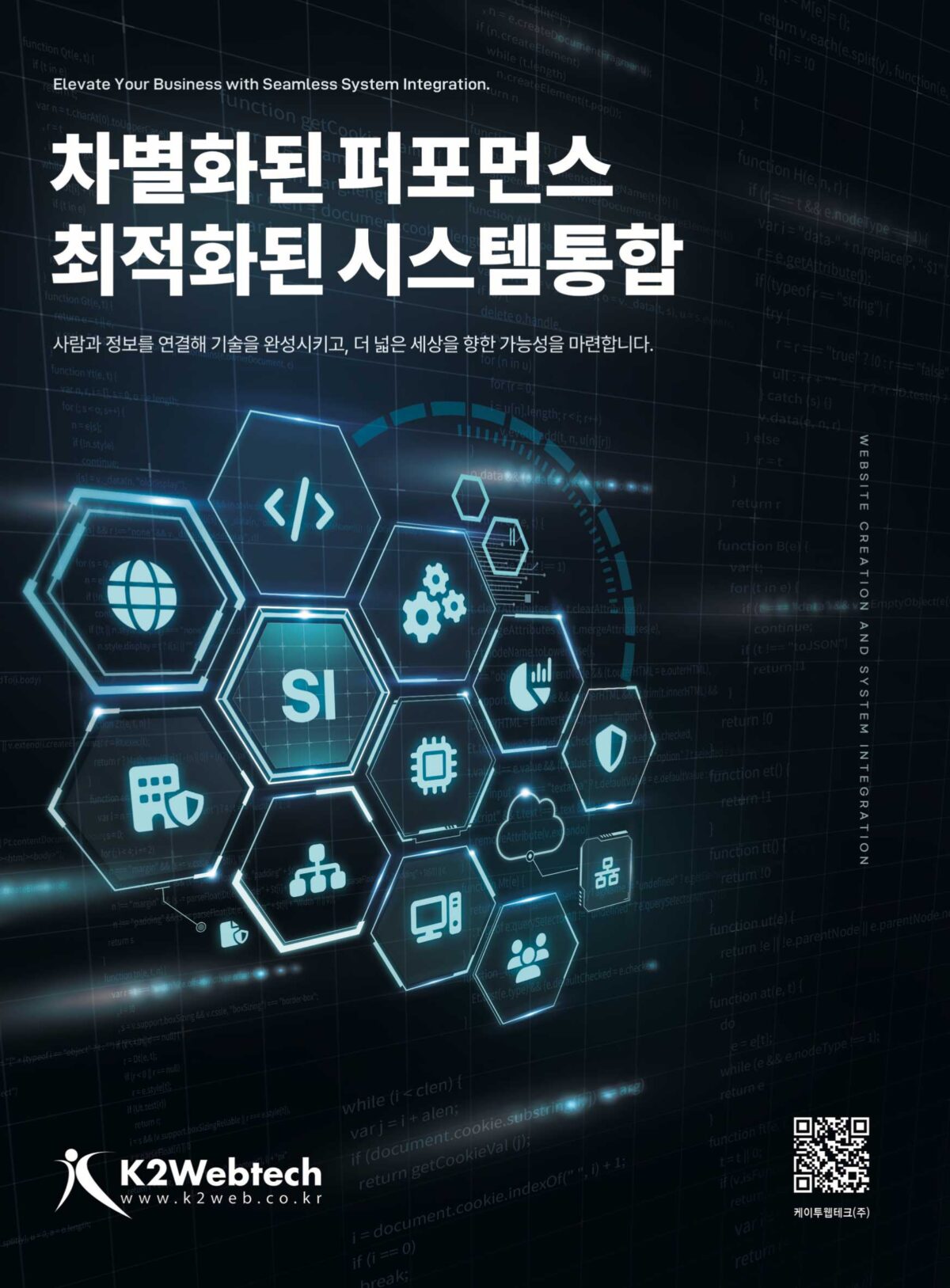트리즈(TRIZ)를 통한 문제해결2
게슈탈트 심리를 이요한 문제해결

트리즈라는 문제해결 방법론은 기술과 과학의 발전과 확대에 따라
지금도 진화 중이며, 진화해야 한다.
트리즈의 진화
지금까지 트리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트리즈는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모순을 찾아내고, 그 모순을 극복하려는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경영 이론이다. 이는 구소련의 과학자 알트슐레르(Genrich Saulovich Altshuller. 1926~1998)가 1946년부터 1985년까지 그의 동료와 제자들과 함께 약 20여만 건 이상의 특허를 분석하고 거기에 존재하는 공통의 문제해결 원리를 40가지로 정리한 것이다. 현재 경영, 사회, 소프트웨어 등 비기술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는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What to Solve)를 얘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How to Solve)를 얘기한다.
이렇게 탄생한 트리즈는 1961년에 「How to learn to invent」라는 도서로 출간되고, 트리즈 연구소와 학교가 설립되면서 영향력을 키워왔다. 이후 1970년대 중반에는 구소련 80개 도시에 100개의 트리즈 학교가 만들어지면서 그 영향력을 확산시켰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VE기법(Value Engineering)과 연계된 트리밍(Trimming) 기법, 문제의 정의와 관련된 ISQ(Innovative Situation Questionnaire), 신뢰성 기법과 관련된 AFD(Anticipatory Failure Determination), 기술진화 법칙을 개선한 DPE(Directed Product Evolution), 문제의 유형을 현상으로 구분하고 현상별 표준해법을 정리한 System Operator 등으로 확장되면서 연구가 활발해 졌는데, 이를 ‘Contemporary TRIZ’라고 하며 기존의 기술과 공학 중심인 ‘Classical TRIZ’와 구분하고 있다.

출처. 한국트리즈협회
이처럼 기술과 공학을 기반으로 탄생한 트리즈는 이후 건축이나 컴퓨팅 기술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문제의 해결’이란 이슈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과 AI 등 또다른 기술적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음을 가리킨다. 문제해결의 대상이 확대 또는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술적 방법론으로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용자의 심미적 사용성에 관련된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이다.
시각 심리, 게슈탈트 심리
트리즈는 기술과 공학 전반의 문제해결을 위한 40가지의 발명원리를 설명한다. 앞 장에서 우리는 그 40가지의 원리 중 시각적 원리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일부 사례를 알아봤다. 이렇게 문제해결의 다양한 방법을 시각적인 부분 위주로 다루는 이유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많은 문제가 시각적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시각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인간 심리에 의한 기술의 지향점과 그러한 제안을 위한 시각적 구성에 자주 활용되는 게슈탈트 이론을 소개하며 문제해결의 방향성에 도움을 주려 한다.
게슈탈트(Gestalt)는 ‘조형’을 의미하는 ‘Gestaltung’을 어원으로 하는 독일어에서 왔다. “전체·형태·모습” 등의 뜻을 가진 명사에서 유래됐고 단순한 형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Form’이나 ‘Shape’라고 하지 않고 사물이 배치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Configuration’으로 쓰이거나 그대로 ‘Gestalt’로 쓰인다. 1890년 오스트리아 에렌펠스에 의해 심리학 분야에 도입되었으며, 게슈탈트 이론에 대한 심층 연구는 1912년 베르트하이머에 의해 시작됐다.
게슈탈트 심리학(Gestalt Psychology; 형태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게슈탈트 이론(Gestalt theory)은 시각언어를 통한 눈과 두뇌 간의 시각정보처리 처리 과정을 연구하는 이론이다. “대상이 의미하는 것을 결정하는 형태의 개념은 지각적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라며 지각은 규칙적이고도 안정된 형태를 만들어내려는 경향이라고 설명한다. 그러한 지각현상을 토대로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았다.

우리는 대상을 눈이라는 감각기관으로 통한 A 과정에서 인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로 전달되는 B 과정이 본격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위키피디아
대상의 피상적인 형태가 인식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니며 뇌에 의한 2차 과정에서 다시 인식된다는 것이다. 뇌에 의해 재편집돼 인지된다는 것이 게슈탈트 이론의 핵심이다. 그 특징은 다양한 사례와 실험으로 설명된다.

지금까지 시각적 문제해결을 위한 게슈탈트 이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 이처럼 시각적 문제의 해결 방법론은 기술로 시작된 트리즈와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한다. 트리즈라는 대표적인 문제해결 방법론이 시대와 기술에 맞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듯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법론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창의적 생각을 바탕으로 한 상황에 맞는 문제해결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 ‘트리즈(TRIZ)를 이용한 문제해결 2’에 역설적인 주장을 하려 한다.
심미적, 심리적 문제해결
21세기에는 기술 평준화에 따라 디자인의 가치가 중요했던 시절과는 다른 가치가 형성되고 있다. 바로 기계적 문제를 벗어난 사용자와의 문제다. 따라서 21세기의 문제해결은 어떠한 이론적 매뉴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맞게 소통하며 변해야 하며, 변하고 있다.
최근 이슈를 살펴보자.

구글에서 햄버거의 이모티콘에 사용된 이미지가 전 세계 누리꾼의 질타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구글 CEO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면서까지 이 논란을 해결하고, 사과까지 하며 오른쪽의 이미지로 바꿨다.
일반적인 햄버거는 치즈가 빨리 녹도록 패티 위에 치즈를 올린다. 그런데 좌측 햄버거 이모티콘은 위에서부터 빵, 상추, 토마토, 패티, 치즈 그리고 빵 순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후 구글은 햄버거 이모티콘을 오른쪽과 같이 수정했으며 또한 맥주가 다 차지 않은 잔에 거품이 올라온 이미지, 치즈 구멍의 명암 등에 대한 논란에도 사과했다.


이렇게 시각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Z세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과 모바일기기를 접한 SNS네이티브 세대로 문화 소비자의 권력을 지닌 1990년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출생한 인구집단을 칭한다. 이들은 다른 어느 세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즉각적이고 인터랙티브한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디지털에서의 소비권력자로 성장하고 있다.
N세대를 다시 Z세대로 세분화하여 세대를 이해하려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 다른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디지털 언어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디자인 과정에서도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N세대를 위한 웹 환경 기획과 디자인이 고스란히 Z세대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Z세대는 웹보다 한정된 인터페이스 영역에서 즉각적이고 동적인 정보전달 방식을 취한다. 그러면서도 시각적 언어를 소비하고 생산한다. 같은 디지털 세대라 해도 두 세대에 나타나는 시각적 특징으로 미뤄보면 서로 다른 언어를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이미 많은 서비스 기획에서 적용되고 있을 것이다.
기술은 우리 인류가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우리로서 살아남게 한 유일한 경쟁 무기였다. 기술은 지속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고 그 해결된 문제를 발전시키며 이어졌다. 하지만 인류의 연속과 종속에 기술만 이바지한 건 아니다. 과학과 예술도 발전하며 우리가 우리로서 살아남게 하는 원천을 제공해 주고 있다.
성 빅토르의 후고는 “예술의 도움으로 인간은 인간 본성의 모든 결점을 좋게 만드는 것이다.”라 말했다. 즉 인간은 인간 본성의 결점을 좋게 하려고 예술을 탄생시켰으며, 그 유용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 진리나 법칙으로 발견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이처럼 이 둘은 서로 다른 가치와 목적으로 태어나 발전해 왔다. 예술은 시각을 비롯한 청각 등 심리적 유희와 안정을 기반으로, 기술은 생산성을 기반으로 하는 유용성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지금은 두 영역이 디지털이라는 속성과 미디어에 의해 하나의 목적을 향해 발전하려 한다. 디지털 시대의 기술은 인간의 심리를 통해 미적 목적을 달성하며, 인간 본성의 결점을 좋게 하기 위한 기술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는 무엇을 문제 삼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창의적인 발상을 해야 할까?
변화의 속도는 개발과 디자인, 그리고 경영자의 능력을 뛰어넘고 있다. 이모티콘에 나타난 작은 시각적 문제에도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기업이나 디자이너가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 발상은 단순히 새롭고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그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절차적인 부분에도 크게 신경써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력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음 장에서 다소 보수적인 분야인 법에서는 창의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