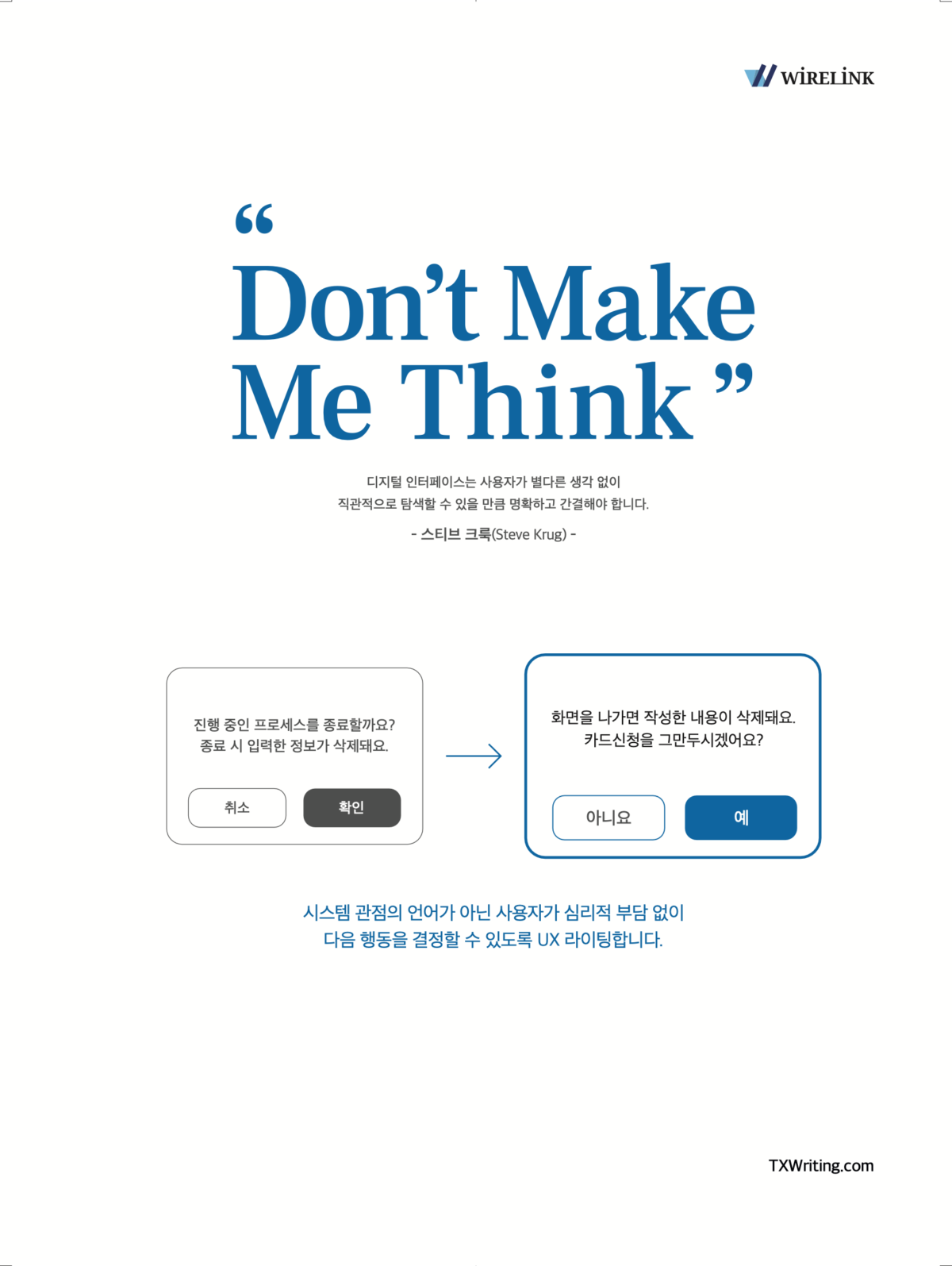커뮤니케이션의 정치
사람들은 본래 커뮤니케이션을 싫어한다.
01. 주저하는 당신에게
02. 다시 꺼내는 기획자 무용론
03. 커뮤니케이션의 정치
04. 프로젝트는 왜 성공하는가?
05. 비틀어보는 리더십과 팔로워십
사람들은 본래 커뮤니케이션을 싫어한다. IT 기술의 발전은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해온 성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덜하게 할지에 대한 혁신일지도 모른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미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다반사다. 전 국민이 쓴다는 메신저의 경우 사람 간의 소통을 최대한 비동기화시키기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두말할 것 없이 모든 표현 양식의 총합이며 좁은 범위에서는 말과 글의 기술에 대한 요약으로도 볼 수 있다. 말과 글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행동을 제약 혹은 확장하도록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거슬러 올라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정치가들만 보더라도 연설을 통해 사람들을 움직여 큰 전쟁을 결정하거나 자신들의 공동체에 대한 긍지를 일깨우곤 했다. 예나 지금이나 말의 기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점에서 대체 불가능한 탁월성의 영역 중 하나로 보인다.
하지만 수많은 정보를 다루고 누구나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만 하는 현대 사회 시스템에서는 몇몇 사람의 탁월성에 기반한 말의 기술에 커뮤니케이션을 오롯이 맡길 수 없다. 물론, 즉각적인 진정성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말의 기술이 여전히 유효한 방식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진정성이라는 태도 때문에 논쟁적 구조인 커뮤니케이션이 그저 말본새로 오인되는 측면이 있다.
말은 정보와 감정을 동시에 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의 본새는 윤리 규범 내에서 스스로 인격체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태도에 달려 있을 뿐이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방점은 정보에 찍혀야 하며, 정보는 힘과 방향을 가진 벡터값으로 흘러갈 때 그야말로 값어치가 있다.

사회생활에서 ‘커뮤니케이션’만큼 많이 그리고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도 없다.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수단으로 서로 간에 신뢰를 묶거나, 또는 억측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게다가 커뮤니케이션을 한 능력으로 간주해 개개인을 평가하기도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능력으로 사용했을 때 대부분 사람은 말투, 태도, 용어 선택의 경험으로 선입견을 가지는데, 그래서 “그 사람, 커뮤니케이션은 어때?”라고 물어보면 대개가 “나이스합니다.”라거나 “재수 없습니다.”라는 식의 대답으로 대상의 정체성을 설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말본새이며 인격체의 수준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흐름’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은 정보의 힘과 방향을 정하는 기획과 각색을 의미하며, 정확한 크기의 정보를 적합한 장소에 위치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IT 기술은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사람 간에 발생하는 감정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보의 벡터양을 시종일관 늘리기 위해 활용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이메일의 TO와 CC의 구조를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보내는 사람의 정보가 가진힘의 세기는 TO, 적절한 방향은 CC이다. TO가 직접 정보를 알려주고 할 일을 전달하는 개념이라면 CC는 공유의 개념이 된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은 TO와 CC가 서로 조정하거나 협의하도록 한다. 적당한 힘과 적절한 방향으로 흐른 정보의 작은 성공인 셈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흐르지 않는 정보는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기에 가치가 없다. 커뮤니케이션은 흐름의 기술로서 정보에 지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지위가 정해진 정보는 TO, CC로 흐름을 타는데 이러한 과정 및 결과에서 공정하거나 정의롭기보다는 양과 질적인 면에서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대체로 의도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 의도가 바로 정치다.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듯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정보는 흐르면 흐를수록 그 양과 질이 확대되기 마련이다. 또 그로 인해 판단해야 할 경우의 수도 많아진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가 위치한 곳에서는 의사 결정이 일어나게 된다(일어나야만 한다). 일이 잘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정보가 운동에너지를 가지지 못하고 의사결정이라는 위치에너지를 가지지 못할 때다. 하지만 정치는 마땅히 흘러야 할 에너지를 멈추게 하거나, 더 넓고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야 정치는 계산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이상적일 때는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기술적 재능과 함께 정보를 정직하게 고집하는 양심이 갖춰질 때다. 사람들은 이러한 올바름을 추구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익이 쉴 새 없이 충돌하는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 대상들은 최선이란 과정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런 과정은 가족, 친구, 연인 간의 소통에서나 알려지는 노력이다. 결과로 모든 과정이 요약되는 대상들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보의 힘과 방향을 결정하려는 계산적인 의도는 구조적인 군림을 굳건하게 한다거나, 지속 가능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나마 갖춰지는 협조 체계를 조직하고자 부단히 애를 쓴다. 정치가 가미된 커뮤니케이션은 그렇게 기득권을 수성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의도는 한결같이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이 어떻게 되던 내가 추구하는 행복은 윤리적이라고 믿는 사회, 무엇이 파괴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믿음이 가득한 사회는 얼마나 정밀하고 험악한가. 그럼에도 수많은 삶의 이름들이 소리로 또 문자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기록해내려 전진하고 있다. 사실 선의로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은 전진하는 것뿐이다. 그 행진에 아낌없는 박수를…
그리고 한 가지 더, 언젠가 남을 관찰하듯 나의 커뮤니케이션을 관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면 선의가 부화뇌동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