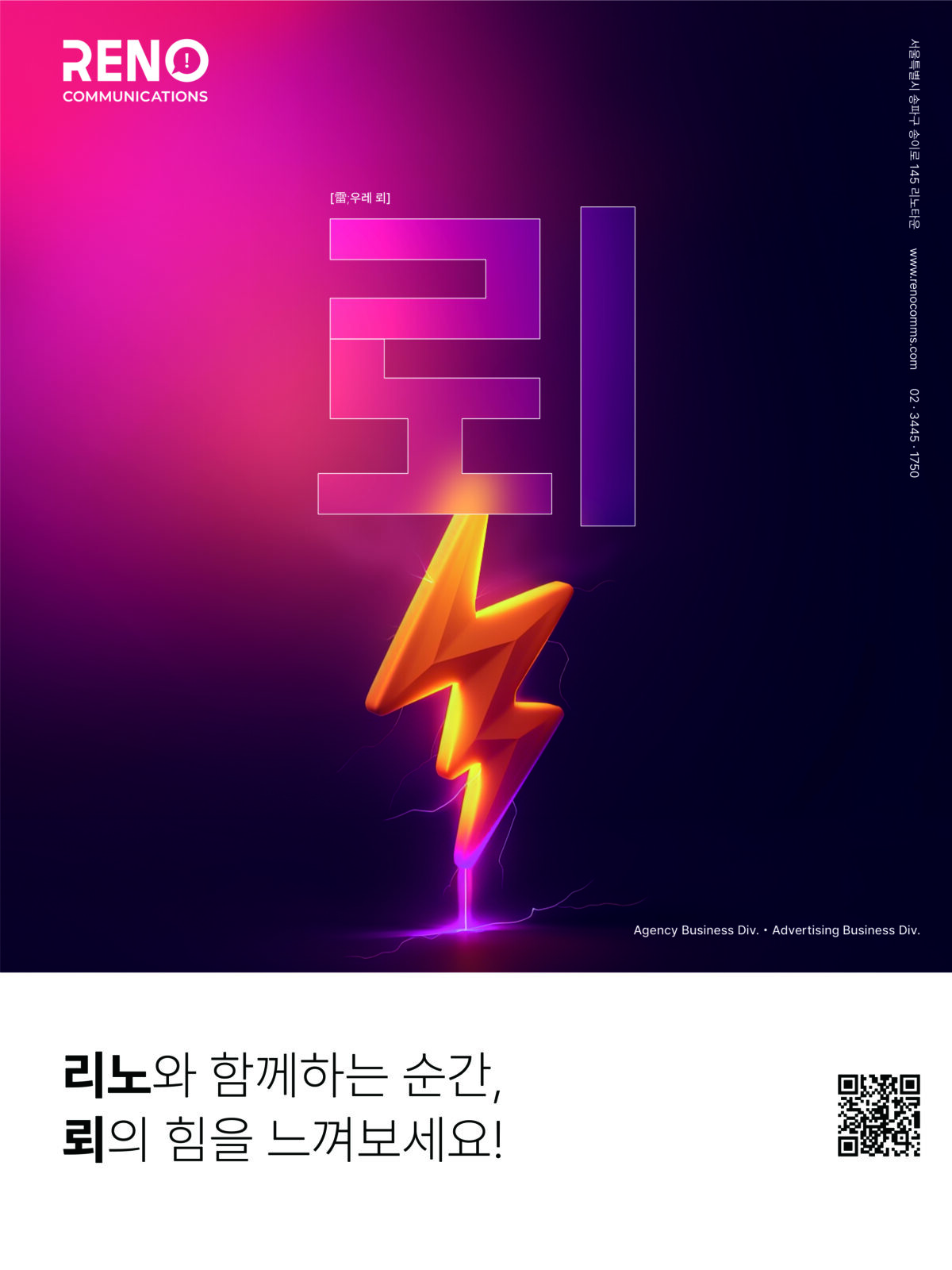제작 과정 중심의 한글디자인 배우기②
완성형 활자 디자인 2 – 이론과 실습: 기획에서 정한 방향과 디자인으로 글자를 다듬으며 채워가는 과정
“아무래도 부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민부리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제안하셨다. 초기에 부리를 넣었다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제외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흐물흐물함에 난항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다. 친구에게 글자체를 보여줬더니 이런 말을 했다.
“손글씨가 콘셉트냐?”

그 정도로 단단함이나 또렷함이 부족했다. 어차피 막막한 상황이라서 부리를 넣기로 했다. 약간 걱정이 됐지만, 더 안정감 있는 인상을 위해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도 심리적 저항이 있어서 짧은 부리로 변경했다.


이전 수업에서도 [ㅁ] 같은 자소의 왼쪽 아래에 있는 ‘굽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흔히 ‘현대적으로 바꾼다’는 이유를 들어 매끄럽게 깎아내는 경우가 많다. 본문용 활자는 저 작은 굽이 크기 균형을 맞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리체에서 부리만 삭제해 다듬으면 오른쪽과 같은 형태가 나온다. 별로 이상할 게 없어 보이지만 이 둘은 ‘공간에 따른 시각적 크기’에서 큰 차이가 있다.

두 글자가 자리한 공간을 시각화하면 대략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리고 이 둘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이미지. 부리가 있는 ‘마’가 확연히 크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작게 볼수록 이 크기의 차이는 현저하게 드러난다.
부리를 삭제하면 첫 닿자(자음)가 왜소하게 보이는데 이를 보완하려고 키우면 속공간이 의도보다 훨씬 크게 보인다. 크기를 아무리 미세하게 조정해도 작게 출력해 확인하면 의도와 전혀 다른 크기로 보여 어렵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부리가 닿자의 속공간을 유지시켜주면서 크기를 확보해 안정감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받침이 있는 글자를 보면 차이가 잘 드러난다. 어느 쪽이 더 안정감 있는 구조처럼 보일까? 오른쪽과 같은 상태를 ‘밖 공간이 많다’고 얘기한다. 이 둘의 균형은 글자체의 가독성에 영향을 미친다. 절대적으로 뭐가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밖 공간이 많아지면 글줄이 들쭉날쭉해져 본문용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홀자(모음) 기둥의 부리를 삭제하면 첫 닿자와 결속력이 약해지는 글자가 발생한다. 부리가 막아주던 공간이 열리면서 더 넓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ㅇ]에서 더 심하게 느껴지는데 자꾸 간격을 좁혀서 해결하려다 보니 글자가 의도와 다르게 좁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그대로 두면 닿자와 홀자가 따로 놀면서 글자에 힘이 약해진다.
이런저런 요소들 때문에 선생님은 부리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 수업시간에 자주 말씀하시던 것들이었는데 그때는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직접 해보면서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 조금은 이해된다. 고딕 활자들은 구조적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는 것 같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변경된 부분을 요약해보면 이렇다.
크기를 키웠고 짧은 부리를 추가했다. 그리고 날카로운 획들을 더 뭉툭하게 변경했다. 첫 닿자의 인상을 조정했고 날카로운 획 끝처리를 더 뭉툭하게 변경했다.

획 시작 부분에서 기울기를 없애 담백한 인상을 강화했다.

이렇게 [수업 1]의 결과물보다 한 발짝 정도 나아졌다.
“<아티클>은 모바일 환경을 고려한 본문 활자입니다. 기사나 짧은 글을 제공하는 앱 환경을 생각하며 기획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앱은 전자책을 제외하고 민부리 계열의 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리 계열의 활자의 획과 공간의 변화가 심해서 앱 환경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앱 환경에서 쓸 수 있는 부리 계열의 활자를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아티클>은 부리 계열의 온화한 인상과 민부리 계열의 수수한 인상을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글자체 이름은 [아티클, Article]로 정했다. 브런치나 미디엄 같은 짧은 글이나 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생각하며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 히읗 – 일곱 번째

[수업 2]를 진행하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껴 끝나면 무조건 쉬려고 생각했는데 곧바로 전시 준비가 시작됐다. 함께 수업을 들었던 4명과 이전 기수 학생들, 그리고 용제 선생님이 지도하는 계원예술대 학생들을 포함해 14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한글 타이포그라피 학교에서는 수강생들의 결과물로 매년 [히읗] 전시를 열었다. ‘6회 전시’는 나도 갔었는데 결과물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다. 완성형 활자 수업을 듣게 된 계기기도 했다. 힘들었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
어느덧, 수업도 끝나고 전시회도 끝났다. 이제 완성하는 일만 남았다. 매주 토요일마다 활자 공간에 모여 선생님과 점검 한다. 글자도 꾸준히 추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순조롭지만은 않다. 작게 봤을 때, 획들이 또렷한 느낌이 없었다. 선생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셨다. 단순하게 선을 직선으로 그린다고 또렷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고딕을 예로 설명해주셨다.


이 획처리를 보자. 획 처리 방법 중 하나로 ②이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획이 많아져도 속공간이 확보되며 뭉침이 적어지고 획의 양끝에 힘이 생긴다는 점이다. 예전 활자에서 사용됐지만, 요즘은 ‘현대화’라는 명분 아래 사라지고 있다.
이 크기로 보면 ①이 깔끔하고 선명해 보인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고르지 않은 회색도다. 회색도를 맞추기 위해 획을 얇게 그리면 글자에 힘이 약해지고 힘을 맞추려고 굵기를 조절하면 그 글자의 회색도만 진해 보이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들의 활자를 비교해보자. 눈을 희미하게 뜨고 봤을 때 어떤 활자의 회색도가 고르게 보이는가?

SD고딕 네오는 ‘활’, ‘빼’의 농도가 진해 글줄이 얼룩져 보인다.

획 처리를 ②으로 한 중고딕은 굵기를 유지하면서도 농도면에서 편차가 매우 적다.

Noto Sans는 굵기를 Light정도로 설정하면 농도의 편차가 적어 보인다.
획 대비가 큰 부리 계열 활자들은 획 중간 부분의 굵기가 얇아도 또렷해 보인다. 굵은 부분이 얇은 부분을 보완해 주기 때문이다. 해서체를 기본으로 민부리 인상을 추구하려던 내 글자체는 그런 딜레마가 있었다. 애초에 붓으로 썼다는 느낌을 없애기 위해 획 처리를 밋밋하게 했는데, 해서체 구조에서는 흐려 보이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 같다. 활자 면적이나 구조에 따라 영향을 끼치는 것이 더 있을 것 같지만, 일단 획 모양 개선이 우선이었다.

붓의 시작과 끝처리 느낌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앞에서 말한 ②의 획 처리를 이 글자체에 적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나눔 명조가 그런 방식의 획 처리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피해야 했다. 이렇게 신나게 글자를 그려나갔다. 그러나 붓쓰기의 특징을 가져오면서 짧은 부리를 유지했더니 한 가지 오류가 발생했다. 가로획 부리와 세로획 부리가 다르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왜 다르게 처리하셨나요?”
선생님이 나에게 질문했고, 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1,000자가 넘어가던 상황에 이것들을 다 바꾸려고 보니 머릿속이 하얘져 변명거리만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텀블벅 후원을 준비하고 있던 과정에서 이런 변경은 분명 스트레스였다. 하지만 막상 변경해보니 인상이 훨씬 담백해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느낀 점은 선생님의 지적은 그 순간에 거부감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좋아질 때가 많았다는 점이다. 역시나 아마추어는 혼자서 완성도 높은 글자체를 만들기 어렵다.
3년 가까이 이처럼 꾸준히 글자만 그렸다. 주말에도, 연휴에도, 유럽여행 중에도 틈만 나면 그렸다. 그리고 5월은 텀블벅 후원자들에게 완성된 활자를 전달하는 달이다. 긴 여정이 일단락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