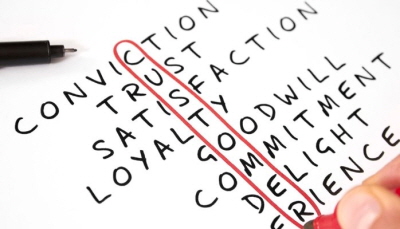김 다윤님의 아티클 더 보기
아름다운 꿈속을 헤매다 – 구시대의 에이전시
세 사람, 세 가지 태도, 한 가지 일.
아름다운 꿈속을 헤매다
– 구시대의 에이전시
안녕하십니까? 20년간 디지털 에이전시 사업을 해오고 있는 아이뱅크 정용관 대표입니다. 앞으로 직면하게 될 대한민국 에이전시 산업에 대한 고민이 많고, 또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에이전시 업계가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 4회차에 걸쳐 오늘날의 에이전시가 처해진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정글과,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덕목과 요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다양하고 소형화된 디바이스, 주체적인 소비자, 새로운 경쟁상대로 등장한 컨설팅 업체와 난무하는 데이터 속에서 에이전시의 경쟁력 있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에이전시의 어제와 오늘을 타산지석(他山之石) 삼고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 아름다운 꿈속을 헤매다 – 구시대의 에이전시
- 이제는 현실을 자각할 때 – 스마트 에이전시
- 뱅뱅뱅! – 새로운 시대의 도래
- 크기는 숫자에 불과하다 – 하지만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ice, c[OLD] Agency – the era of dreams, bubbles and martinis
영화가 심어준 선입견이겠지만, 모름지기 ‘에이전트’라고 하면 007과 같은 정부 기관의 비밀 에이전트이건 ‘제리 맥과이어’ 같은 대형 마케팅 회사의 에이전트이건, 딱 떨어지는 수트 혹은 칵테일 드레스 차림으로, 한 손에는 올리브가 꽂힌 더티 마티니(Dirty Martini)를 들고 파티장에 있어야 할 것만 같다.
우리말로는 다소 무미건조하게 ‘대행사’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영문 ‘Agency’라는 단어에 내재된 화려한 의미 때문인지 표기만 한글로 하여 ‘에이전시’라는 말이 업계에서는 더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폭발적인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디바이스의 소형화 및 대중화로 사회·경제·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종 사용자 개인(End User)과의 직접 접촉이 보다 중요해지고 가능해진 지금, (특히 고객의 관점에서)에이전시의 존재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제기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듯 한때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생겨나던 에이전시 중 문을 닫거나 업종 변경을 하는 곳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아이뱅크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법적으로 치면 스스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성년이 될 만큼의 세월이고, 옛말에 따르면 강산이 두 번은 변할 시간이다. 찰나와 같이 짧았던 시간 같으면서도, 조용히 되짚어 보면 두 명으로 시작했던 작은 회사가 이제는 200명이 넘는 조직으로 성장했으며, 처한 디지털 환경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제법 튼튼한 뿌리를 내리기까지 지난 20년 동안 아이뱅크 역시, 질풍노도와 같은 어려운 격변기를 보내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다. 초중고 동창들이 하나 둘 흩어지듯, 경쟁하며 의지했던 초창기 에이전시 주역들 중에 오늘날까지 최전선을 지키며 선의의 경쟁을 하는 에이전시가 이제는 많지 않다. 다행히, 젊은 혈기와 열정만 갖고 조촐하게 출범한 아이뱅크가 이제는 디자인, 개발, 기획, 컨설팅, 콘텐츠, 디지털마케팅을 망라한 다양한 에이전시 사업을 담당하는 ‘디지털웍스(DigitalWorks)’ 사업본부, 솔루션/소프트웨어/하드웨어 유통부서에서 거듭난 솔루션 사업부 그리고 최근에 급 성장세를 보이는 데이터컨설팅 사업부까지 시장의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내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디지털웍스(DigitalWorks)’라는 에이전시 사업본부는 규모 면에서 아이뱅크의 2/3 정도를 차지하는 중추적인 조직이고, 타 사업부도 사실상 ‘디지털웍스’ 사업본부와의 연계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탄생됐다. 업계에서는 아직도 ‘디지털웍스’와 ‘아이뱅크’가 혼재되어 사용되며 약간의 ‘혼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멀지 않은 시기에 이 부분도 명쾌히 정리하려고 한다.
나는 20년 동안 우직하게 에이전시 업무를 지속해오며 디지털 환경이 아이뱅크를 변모 시켰듯이, 아이뱅크 또한 이러한 환경에 작지만 또렷한 발자취를 남겼다고 자부한다. 여기저기서 에이전시의 암울한 미래를 논하지만, 나는 역설적이게도 지금이 에이전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대이며, 디지털 환경이 변화, 발전될수록 에이전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The c[Old] Agency – Marketing’s no longer a guessing game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였다. 한 길도 모를 사람의 속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 마케팅이다. 미국 장관 출신이자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John Wanamaker, 1838-1922)의 “내가 마케팅에 쓴 돈의 반은 성과 없는 낭비였다. 문제는 어느 쪽 반이 낭비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Half the money I spend on advertising is wasted; the trouble is, I don’t know which half.)”가 이를 잘 대변한다.
과거에는 사실상 과정과 결과 양자 모두에 대해 정량적 측정이 불가능했다. 어워드(Award) 수상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결국 ‘좋은 결과(Result)’를 측정해주는 가시적 척도로 자리 잡으면서, 에이전시들은 위에서 말한 영화와 같은 파티를 통해 인맥과 인지도를 쌓는데 열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려하고 크게 포장하는 것이 중요했다. 어워드의 기준이 ‘화려한 포장을 얼마나 더 창의적으로 잘 하는가?’로 자리 잡으면서, 에이전시의 목표는 사실상 의뢰를 하는 기업의 일차적인 목표와 초점에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기업의 궁극적 목표는 창의성이 아니라 고객과 매출 증대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시기에도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쿠폰을 통한 참여도 조사 등 원시적 형태의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향후 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실외 광고, 라디오와 이메일 등 다양한 형태로 재 수집되고 측정, 분석되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 숫자와 그래프를 봐야 심리적 안정과 신뢰를 느끼는 현대인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컸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오래 걸렸기에 당시에는 5년 전 데이터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최신 트렌드를 잘 보여주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될 수 밖에 없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와 달리 다양한 미디어를 미세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아닌 몇 시간이 지난 실시간 데이터로 캠페인 및 세그먼트 마케팅 활동을 한다. 우리는 인바운드 전화 및 문의, 리드 그리고 전환율을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각 지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인사이트를 도출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에이전시가 처한 환경이다.” – Sam Meets, ‘The Modern Marketing Agency’
The l[AS]t Agency – Digital Broke-Up the Party
‘실시간’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던 시대의 에이전시는 태생적으로도 통계와 분석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Last) 에이전시는 통찰하고 선행하여 예측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기 어려웠고, 사실상 새로운 트렌드를 쫓아 가든지 뒷수습, 또는 A/S 밖에 제공할 수 없었다. 사실 이것만 잘 해내기도 벅찼다. 구체적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답답하지만, 동시에 몽롱한 모호함 뒤에 숨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성공에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 진실에 다가서려는 노력을 외면한 채, 일단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만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성공’인 양 착시현상을 주는 흥겨운 파티는 기술 발전을 통한 디지털화(Digital Broke-Up the party)로 산산조각 나 버렸다.
에이전시의 업무가 세분화되어 전문성을 갖추고 분업화 된 것이다.
아날로그 영역이던 미디어와 예술이 점점 디지털의 옷을 입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새롭게 생성된 영역에 대한 선점 및 정복이 필요해졌다. 에이전시는 이러한 미지(未知)의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고 개척하는 파이오니어(Pioneer)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세분화(Fragmentation)된 업무에 따른 ‘전문화(Specialization)’를 이룩했다.
대표적인 에이전시 전문 영역으로 Writing, Social Media, SEO, PR, Design(내부적으로 UX 등으로 더욱더 세분화), Websites, Email, Inbound Marketing 그리고 Content Marketing이 굵직하게 자리를 잡았다. 디지털 환경의 발전은 10년이라는 정기성(定期性)도 장기성(長期性)도 주지 않고, ‘무어의 법칙’(Moore’s Law)으로 대표되는 자비 없는 발전속도를 보였다.
에이전시는 기기의 다양화 외에 SaaS(Software-as-a-Service) 정착, 그리고 자칫 역설적으로 보이는 인하우스(In-House) 마케팅 부서의 증가와 동시에 아웃소싱의 증가에 대처해야 했다.
하지만 에이전시의 가장 큰 도전이자 사실 위에 언급한 모든 변화의 시작이자 끝은 단언컨대 ‘소비자(Consumer)’의 개념 변화이다. 바로 주체적인 개인이 등장한 것이다. 소비자는 더 이상 객체이길 거부했다. 새로운 시대의 소비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소통하길 원했다.
에이전시는 이러한 새로운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맞춰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 분석적이고 신속·유연한 사고를 하는 마케터
The new marketers: analytical, fast and adaptable - 실시간 추이가 반영된 데이터와 매트릭
The new metrics: available from the very first moment - 단순한 브랜딩을 넘어선 성과 지향 마케팅
The new models: from branding to *performance marketing
↑performance marketing: (정의) 일명 성과 마케팅은 달성한 결과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는 디지털 마케팅 모델을 말한다.
n[EX]t Agency – SMART Agency and how it has to work
주체적인 소비자 외에 에이전시가 직면한 또 하나의 도전은 Accenture와 Deloitte 같은 대형 ‘컨설팅 회사’가 새로운 경쟁상대로 대두한 것이다. 이들은 막강한 자금과 명성(Name Value)으로 무장한 채, 시장에 난립해있는 에이전시들을 집어삼키며 공격적으로 진입했다. 가트너(Gartner)에서 낸 ‘2018년 3월에 주목할 에이전시’ 자료에는 컨설팅으로 익숙한 이름들이 눈에 띈다.
‘에이전시(Agency)’와 ‘컨설팅 회사(Consulting Company/Group)’와 ‘컨설턴시(Consultancy)’의 경계가 붕괴되어 영역이 섞이고 있는 것이다.
(A business or organization providing a particular service on behalf of another business, person, or group.)
– Consulting Company: 관련자 또는 전문가에게 보다 전문화된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The business of giving expert advice to other professionals.)
– Consultancy: 특정 분야의 전문가 그룹에 보다 전문적인 프랙티스(practice)를 제공하는 조직.
(A professional practice that gives expert advice within a particular field.)
이 부분이야 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느낌이 조금 더 잘 전달될 것 같다. 즉, ‘대행사’인 ‘에이전시’, ‘자문과 조언’을 제공하는 ‘컨설팅 회사’와 ‘컨설턴시’. 컨설팅 회사들의 성공 뒤에는 이미 언급했듯이 자금과 명성이 한 몫을 했다. 또한 ‘크리에이티브(creative)’라는 샛길로 빠진 에이전시와 달리, 컨설팅 회사들은 장기간 데이터에 기반한 자문 경험을 내세워 고객에게 ‘데이터 기반(Data-driven)’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를 주었다.
‘브랜드 인지도’보다 ‘고객 경험(Customer Experience)’을 더 중시하게 된 오늘날, 에이전시들 또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고 이 부분을 보강하고 있다. 이제 에이전시도 모름지기 적합한 메시지(Right product message)와 함께 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그 성과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툴(Right marketing tool)로 무장해야 한다.

그렇다면 타파해야 할 난관이 이토록 많이 산재한 에이전시는 자신의 존재가치와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변모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부터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입이 근질거리니 맛보기 예고편을 한다면, 한 마디로 에이전시는 ‘스마트(Smart)’ 해져야 한다.
분명 방금 문장을 읽고 ‘아무것에나 스마트만 달면 다 되냐.’고 생각하며 피식 웃었을 것이다. 그렇다. Smart란 무엇인가. 영한 사전에서는 ‘똑똑하다, 영리하다, 잘나다, 말쑥하다’ 등의 뜻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미래의 에이전시가 ‘스마트 에이전시(Smart Agency)’가 돼야 한다고 할 때, 상기의 사전적인 의미 외에 다음과 같이 ‘스마트(Smart)’를 정의한다.
즉, 모듈화(Modularization)되고, 민첩하고 유연(Agile)하며, 실시간(Realtime)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응하고 협동심(Teamwork)을 이루어야만 성공(Success)을 거둘 수 있고, 이런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구조의 에이전시야 말로 ‘스마트 에이전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창의적인 현실주의자들(Creative Realists)로 가득한 에이전시이다. 이후 회차에서 더 구체화할 이러한 스마트 에이전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하게 동(動)한다. (Works Smarter: results-driven & value-based)
- 통(通)한다. (Creates Conversion by Conversation: enter the era of UCC)
- 데이터 주도적이다. (Digs into Data: it’s time to get real)
- HYBRID: 협력하는 경계의 확장. (Builds a Stronger Team: meet the HYBRID talents)
위 특징을 갖춘 스마트 에이전시가 지향하는 핵심은 고객 경험, 즉 CX(Customer eXperience)의 ‘C’인 ‘Customer(고객)’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다. 즉, 에이전시에 직접 의뢰를 한 기업 고객 뿐 아니라 이러한 고객의 고객, 또 함께 일하는 동료는 물론, 심지어 타(他) 에이전시 혹은 협력업체까지 모두 ‘고객(Customer)’으로 인식해 예(禮)를 다하는 것이다.
C= Client + Client’s Customer + Coworker
Are you just laying bricks or building a cathedral?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은 개인이 휴대폰에 내비게이션을 탑재하고 다니는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기에 조금 부족하다. 그보다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정도로 구체화 시키고 싶다. 꿈이 메말라 버린 어른들을 위한 동화 ‘어린 왕자’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한 셍텍쥐페리 (Antoine de Saint-Exupery)조차 ‘계획이 없는 목표는 꿈에 불과하다(A goal without a plan is just a wish).’고 말했다. 새로운 소비자에 적극 대응하고, 대형 컨설팅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고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은 구성원 모두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목적과 사업에 대한 이해가 일부 소수에게만 제공되고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이를 보여주는 교회를 짓는 벽돌장이의 이야기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한 남자가 큰 화강암 덩어리를 깎아 내서 벽돌을 만들고 있는 세 명의 석공을 발견했다. 첫 번째 남자는 자신의 일에 불만을 가득 품은 표정으로 계속 시계를 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지나가던 남자가 그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이 첫 번째 석공은 “이 바보 같은 돌덩어리를 망치질 하는 게 안 보이슈? 5분 후에 퇴근인데, 1분이 1년 같소.”라고 대답하였다.
두 번째 석공은 조금 더 집중하여 일을 하고 있었다. 남자는 같은 질문을 하였다. 두 번째 석공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 돌을 다른 돌들과 함께 벽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벽돌 모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석공은 경쾌한 망치질 소리를 내며 열성적으로 돌을 다듬고 있었다. 중간중간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작업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스스로가 최선이라고 만족할 때까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조각까지 조심스럽게 다듬어 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석공은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본 후 반짝이는 눈과 자부심 가득한 미소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저는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세 사람, 세 가지 태도, 한 가지 일.
(Three men, three different attitudes, all doing the same j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