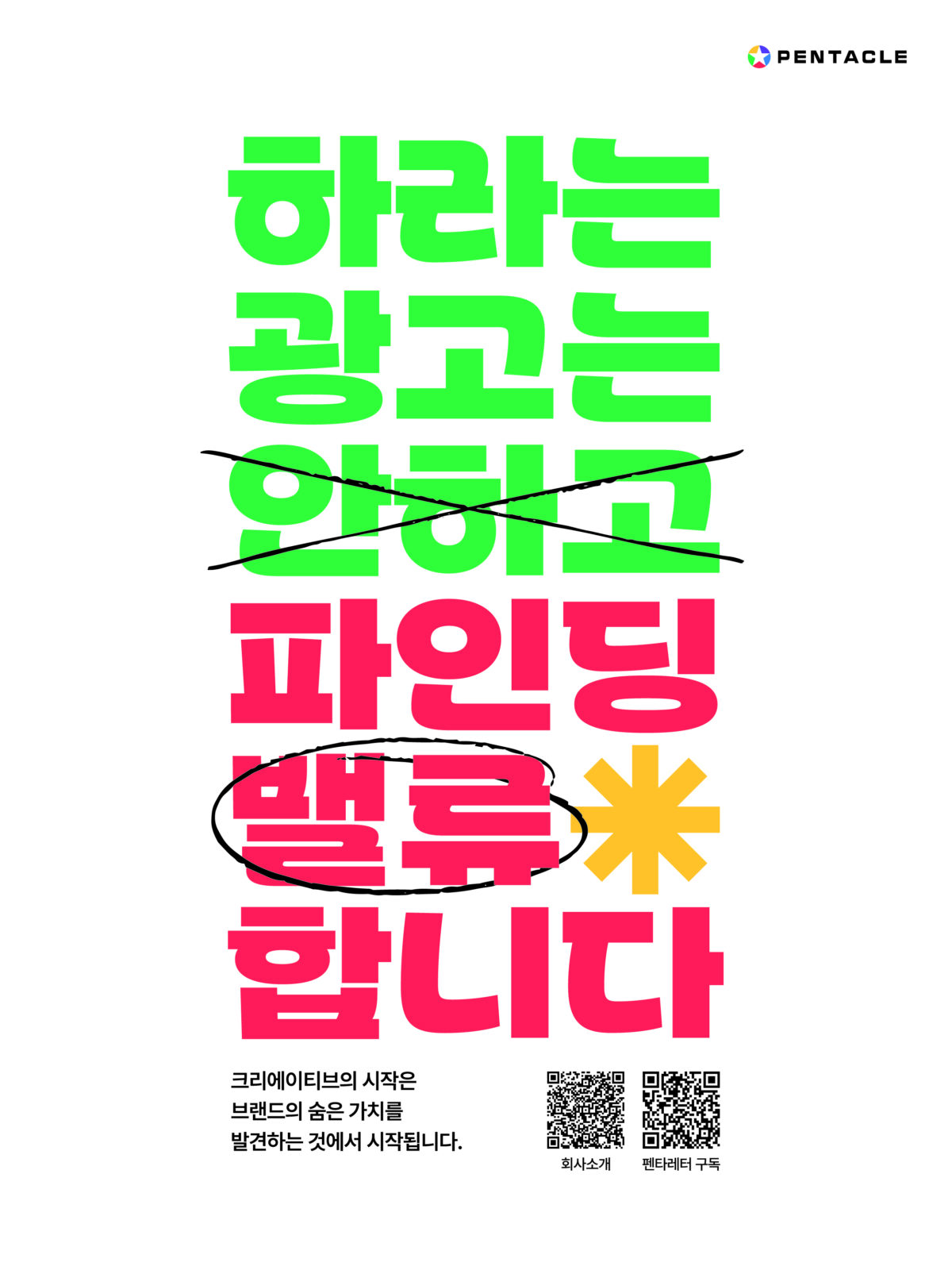성격있는 챗봇 하나 들이십시오
‘얘 왜저래?’와 ‘의지할 만해’ 그 사이를 결정짓는 챗봇의 개성
Intro
메신저 기반 채팅 서비스가 오랜 기간 익숙하게 이용되면서, 챗봇의 형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텍스트 주고받기는 곧 목소리 주고받기로 확장되면서 어느 순간 대화가 가능한 챗봇이 되어 채팅창 형태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비들에서 챗봇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챗봇은 1대 1 대화식인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간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개인적인 데이터를 쌓아 활용할 수 있어, UX적인 새로움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인다.
하지만 기회는 어려움을 극복한 소수에게만 돌아가듯, 챗봇 서비스를 제대로 만들지 않는다면, 애먼 사람들만 고생하다 끝날 수 있는 어려운 서비스 영역이기도 하다.
고객과 이용자를 섞어서 사용하겠지만 하여간 챗봇 이용자는 개인 한 사람에 대해 미세한 맥락을 잡아내서 이용자가 유용하게 느껴 이용을 지속시킨다는 것은, 이용자와 챗봇과의 사회적인 관계의 형성이고 신뢰의 구축이 될 것이다.
챗봇은 자신에게 말을 건 인간 즉, 이용자 혹은 고객에게 소위 응대를 해야 하는데, 충분히 잘 응대하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챗봇도 이제 그 역할에서의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비록 인간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세계의 용어를 종종 빌려서 사용할 것이다).
인성은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거나 할 때 듣는 용어가 맞다. 그리고 이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챗봇에도 주어진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성을 물어볼 때가 된 것이다. 일단 인성보다는 성격이라는 개념이 더 구체적이므로 성격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자.
성격이란
성격(Personality)은 개인마다 지니고 있는 개성과 연관된 것으로서 간략하게 정의하기 쉽지 않다. 연구자에 따라 성격 정의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출처 없이 정의들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이 환경에 독특하게 적응하도록 결정지어주는 심리 물리적 체계의 역동적 체계’, ‘환경에 독자적 상응을 결정하게 하는 개인적인 여러 특징과 행동 양식의 총합체’, ‘개인이 접하는 생활 상황에 대해 독특한 적응을 나타내는 사고와 감정을 포함한 독특한 행동 패턴’,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독특한 존재로 변별해 주는 여러 특성의 총합’ 등등.
종합해보면, 성격이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이 취하는 태도, 행동들과 관련된 것으로서, 타인과 구별될 수 있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격이라고 하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챗봇도 주어진 상황인 사이버상에서의 스스로에게 주어진 ‘고객 응대’라는 상황에서 보여지는 모든 유무형의 요소 중 고정적이거나 반복되어 패턴화된 것으로부터 성격이 구체화되고 드러난다. 따라서 비록 언어를 이용하는 챗봇이지만 언어 말고 다른 것을 가지는 사회적인 존재(Social Being)이므로, 소위 말투만으로 성격을 파악하지 않는다.
대화를 포함하는 상호작용 전체 환경에서 챗봇을 규정지을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하다. 챗봇의 상호작용과 구성요소 일단 인간에게 있어 상호작용(Interaction)은 현재의 환경에서 사물, 사람을 포함하는 다양한 존재물(Entities) 사이에 행하는 모든 것인데, 인간 측면에서 오감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도 포함이라고 보인다.
어떤 상호작용 연구자는 사회적인 행위 간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을 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웹사이트를 예로 들자면 사용자가 웹사이트나 콘텐츠 등과 상호작용할 때 접하는 인터페이스적 요소를 의미하고, 나머지는 해당 화면을 보여주는 과정의 속도, 반응성으로 나누었다.
여기에 표현하는 콘텐츠, 내용의 질적인 부분도 추가하였다. 상호작용은 주고받기의 구조적인 것과 무엇을 주고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적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채팅창을 이용하는 챗봇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는 언어 외의 것을 찾자면 반응의 속도가 있을 것이다. 지난번 칼럼에서 언급했던 것으로는 좀 느리게 답변하는 반응성이다. 채팅창에 질문을 넣고 확인은 눌렀다.
대부분의 채팅창 형태 챗봇은 확인과 동시에 답변 콘텐츠를 좌르륵 펼쳐주는데, 만약 어떤 챗봇이 입력 중이라는 메시지나 심벌과 함께 한 박자 늦게 답변 콘텐츠를 주는 것이다. 처음에는 네트워크가 느리거나 정보 검색하는 시스템이 느려서 답변이 늦게 오나 싶지만, 이용을 거듭해도 여전히 느리게 답변하는 것을 패턴으로 인지되며, 이용자는 그것으로부터 상대방의 성격을 형성시키는데 판단 근거로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좀 답답한 친구군…’ 혹은 ‘매우 신중한 친구군…’ 등.

목소리 양식(Modality)을 가진 AI 스피커의 챗봇은 목소리 하나만 상호작용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일단 그에게는 스피커라는 몸체가 있다. AI 스피커는 그 하드웨어적인 몸체부터 성격 형성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성요소이다. 왜냐하면 대화할 때, 우리는 스피커를 바라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스크린을 탑재한 AI 스피커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장비들은 기존의 AI가 동일하다 할지언정 상호작용 효과나 구성요소는 절대 같을 수 없다. 달라진 장비의 외형이 주는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무튼 스크린이 있는 경우 해당 AI 성격이 드러날 수 있는 주요소로는 스크린에 나타나는 콘텐츠가 될 것이다.
잘 정돈해 순차적으로 보여주거나 혹은 한 번에 나열해서 보여주거나, 다양한 레이아웃과 시각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적인 효과나 콘텐츠의 나타남 등으로 이용자는 내 거실에 들인 챗봇이 신중하고 꼼꼼한지, 혹은 산만하고 정돈되지 않아 이용자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친 성격의 챗봇인지 스크린을 통해 느낄 수 있다.

어쨌든 성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호작용의 요소들은 이렇게 다양하며 이들의 조합으로 서로 다른 느낌을 가진 성격의 개성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다. 즉, 챗봇의 성격은 대화의 톤과 어조뿐 아니라 제공되는 정보 결과물, 제공의 속도감, 움직임 등 모든 요소를 근거로 성격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챗봇의 개성
지금까지 개성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왜냐하면 챗봇의 개성이 사용자 경험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만나 처음 소통할 때는 잘 모르지만, 이야기를 지속하면 상대방의 성격을 서서히 알게 된다. 챗봇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고 머물러 살고 싶어 하는 챗봇의 콘셉트를 잡고 있는 대부분의 AI 스피커들은 인간과 한집에 머물면서 자신의 성격을 서서히 드러내게 된다(이용자에 의해 자동으로 대상에 대한 성격을 형성하는 것임).
챗봇의 성격이 드러나는 날의 UX
챗봇 AI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만큼 비즈니스적으로 좋은 성과는 없을 텐데, 그러는 동안 챗봇의 성격도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챗봇의 성격이 드러나 느껴지는 시점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 시점에서 우리는 고객에게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가? ‘얘 왜 저래’라는 당혹감? 아니면, ‘똘똘해’, ‘일관되게 멍청해서 재밌어’, ‘의지할 만해’, ‘사랑스러워’.
어쨌든, 사용할수록에 내려지는 평가는 당장 만드는 입장에서 고려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진짜 UX 측정이 되므로 제작 시부터 제작 후 검증과 이용과정에서 모두 확인되어 챗봇의 성격을 완성해 준다면 제대로 진화된 챗봇의 두 번째 제너레이션이 열리게 될 것이다.